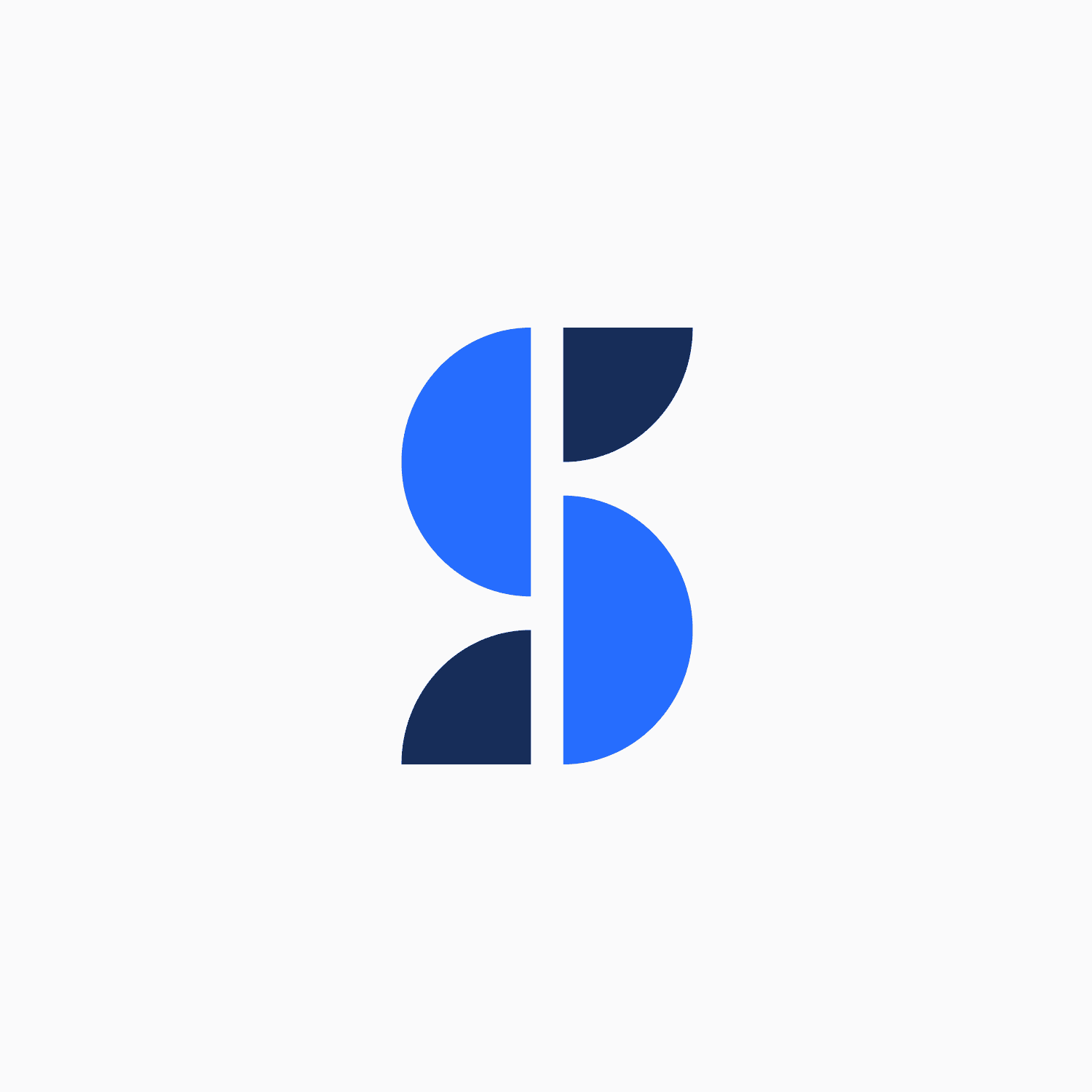국내 영화관 ‘빅3’(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국내 사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영화관 업계는 특별관 확대와 해외 사업을 통해 반등을 꾀하지만, 침체는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 1위 자리를 맡고 있는 CJ CGV는 2023년 영업이익 759억원(연결 기준)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해외 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국내 사업만 보면 76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023년 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나, CJ CGV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사업의 호조에 의해 국내 사업의 적자를 상쇄했다. 국내 사업만 운영 중인 메가박스는 전년 대비 손실 규모를 24.2%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2024년 13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영화관 흥행의 실패는 팬데믹 이후 관객들의 생태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가 급부상하게 되고, 영화 티켓값의 상승으로 인해 관객들은 비싼 가격을 주고 영화를 한 편 감상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독비를 내고 집에서 OTT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을 선택했다. 관객이 원할 때 영화를 배속하고 일시정지할 수 있는 OTT의 편의성은 극장 상영 영화가 OTT로 유통되는 기간이 짧아지며 더 강해졌다. OTT와 마찬가지로 팬데믹 기간 동안 성장한 유튜브의 ‘결말 포함’ 요약본과 숏폼의 유행은 관객들이 영화관에서 긴 시간 영화를 관람할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팬데믹 이후에도 <범죄도시>, <서울의 봄>, <파묘> 등 천만 관객을 모은 한국 영화들은 존재했다. 하지만 성수기에 흥행을 보장하는 텐트폴 영화(영화 투자사, 배급사에서 개봉하는 작품 중 가장 성공이 보장되는 영화)들이 팬데믹 이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결국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설날 연휴 기간은 텐트폴 영화가 등장하지 못했다. 제작비 약 330억원의 <외계+인 1부>는 손익분기점인 730만 명에 훨씬 부족한 150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고, 손익분기점 500만 명의 <비상선언>은 초호화 캐스팅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다. 이후 <아마존 활명수>, <노량>, <1947 보스턴>, <하얼빈> 등 다양한 텐트폴 영화들이 외면받았다. 유명 감독, 초호화 캐스팅, 신파 혹은 클리셰로 구성되었으면 모두 흥행에 성공하며 ‘충무로의 흥행 공식’으로 인정받았지만, 팬데믹 이후 상기한 영화들의 실패로 관객들에게 더 이상 흥행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흥행 부진이 지속되자 투자자들은 영화 투자를 꺼리게 되었다. 부진하는 국내 영화 시장과는 반대로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OTT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들이 글로벌 흥행 돌풍을 일으키자, 제작자들은 더 많은 재량과 투자금을 보장받고 더 많은 관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OTT 드라마들을 제작하게 되었고, 배우들도 이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영화관 업계는 이러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업 비중 확대와 체험형 영화관(특별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입소문’, ‘SNS 바이럴’, ‘서브컬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해외 사업에서의 흑자로 국내 손실을 메꿨다.
CJ CGV는 캐나다의 프리미엄 상영관 ‘IMAX’사와 제휴한 특별관을 운영 중이며, 자체 개발한 ‘SCREEN X’, ‘4DX’ 특별관 기술을 해외로 확장해 특히 SCREEN X 상영관을 통해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70% 증가하는 등 특별관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메가박스는 ‘DOLBY’사와의 제휴를, 롯데시네마는 ‘MX4D’와의 제휴를 맺고 있다. 달라진 관객의 니즈에 맞추어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탈피하여 ‘입소문’과 ‘SNS 바이럴’을 활용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 애니메이션과 온라인 게임 대회, 아이돌 공연, 오페라 등 극장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업계의 반등은 어려워보인다. 고환율 시대에 접어들며 해외에서 작품을 촬영 중인 제작사와 외화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수입사들은 비용 부담이 증가하였다. 특히 수입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화를 수입할 때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20~30% 선지급하고 작품을 수령할 때 잔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계약 당시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 영화의 정상적인 개봉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영화를 수입할 때 비용이 증가한 만큼 손익분기점이 올라가기에 영화 수입에 신중하게 된다.
영화관의 특별관 운영 확대도 한계가 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시청각적으로 더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별관의 차별성이다. 하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풍성한 경험을 느끼게 하려면 해당 특별관 포맷에 맞게 영화를 제작해야 한다. 대표적인 두 특별관인 IMAX와 DOLBY는 각각 <어벤저스>와 <탑건>으로 이름을 알렸다. 관객들은 공감각적인 경험과 재미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입소문’을 통해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국내 영화들의 경우 최초 IMAX 포맷으로 제작된 영화인 <7광구>의 흥행 실패 이후 투자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신과 함께>가 개봉하기까지 7년간 IMAX 포맷의 영화가 제작되지 못했다. DOLBY의 경우 2023년 국내 영화 중 최초로 해당 포맷을 온전하게 적용한 <더 문>이 개봉했지만, 영화의 내용적 한계로 인해 흥행에 실패했다. 특별관 상영이 인기를 끌려면 ‘포맷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영화적 완성도’도 높은 작품이어야 하지만 아직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작품은 없었다.
연이은 흥행 참패와 관객의 외면으로 인해 영화 투자는 감소했으며, CJ ENM과 같은 대형 투자배급사들 역시 긴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의 한국 영화 제작 편수는 약 25편으로 2000년의 58편과 비교하면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의 투자 감소는 내년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인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국내 영화관 사업의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